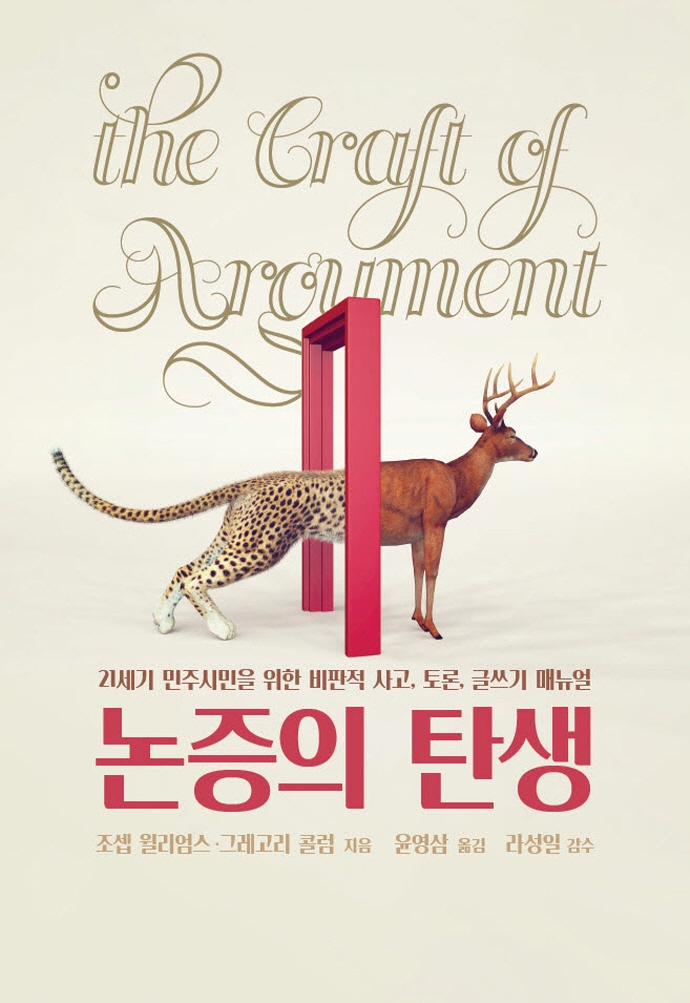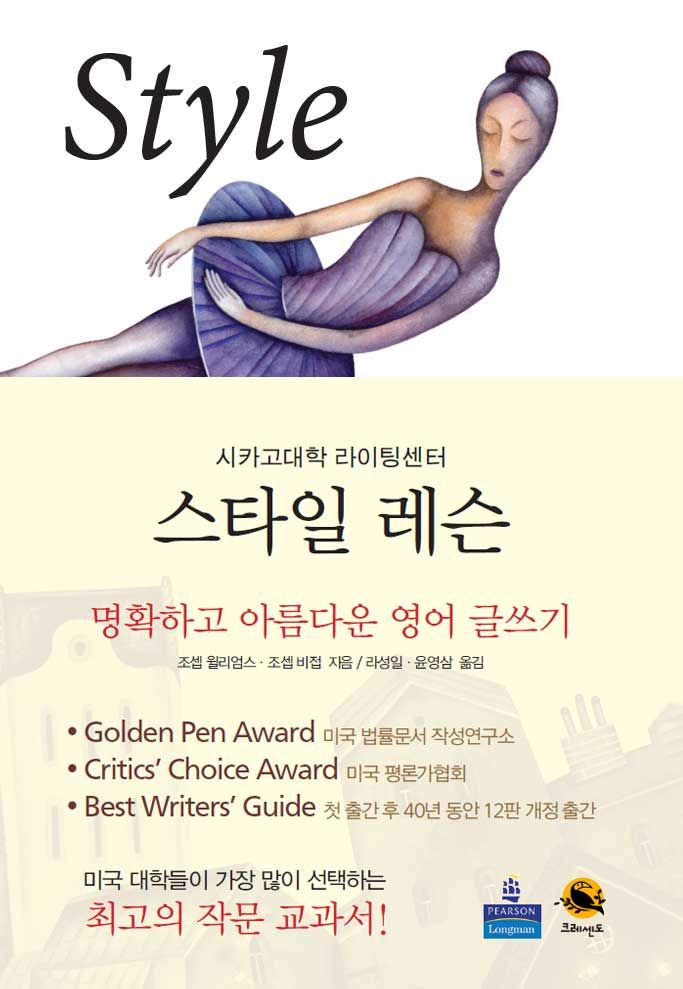Series Reading 논증의 탄생 4
대학에 들어가 첫 작문과제를 제출했을 때 받은 피드백을 기억하는가? 상당히 많은 이들이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다. 공을 들인 과제에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과제물에 적힌 교수의 코멘트는 대개 충격적이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글쓰기는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글쓰기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 차이의 핵심은 바로 ‘논증’에 있다.
논증은 일반적인 글쓰기와 어떻게 다른가?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글쓰기란 대개 어떤 내용을 요약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글을 쓰는 것이다. 이런 글들이 논증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요약
남이 쓴 글이나 강의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풀어쓰기’라고 말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글쓰기는 대부분 ‘요약’이고, 요약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 한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들은 대부분—주제가 복잡해지고 글의 길이가 늘어나기는 했지만—고등학교 때처럼 요약만 잘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가르쳐 준 것 말고 자신의 생각을 쓰라고 요구한다. 내 주장을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또 남들도 거기에 동조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라고 요구한다. 이유와 근거를 더 많이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대학에서 눈여겨보는 것은 주장의 ‘독창성’이 아니다.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이유와 근거로 뒷받침할 줄 아는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에 대해 반박을 할 줄 아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부터 결론에 다다를 때까지 논의를 합리적으로 전개해나갈 줄 아는지 눈여겨본다.
물론 논증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요약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흉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의 의견 (내 생각)
내 생각은 이렇다고 말하는 글이다. 논증과 다른 점은, 남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오라고 하면, 대학신입생들은 대부분 이런 글을 써온다. 이런 글을 쓰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한 마디로 다음과 같다.
이건 내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자유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그걸 굳이 옹호하고 방어해야 돼?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너는 네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걸로 충분한 거 아냐?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건 내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아니 이유가 있든 없든, 남들이 무슨 상관인가?
하지만 대학이라는 학문공동체에 들어서는 순간, 개인의 생각은 더 이상 자유로운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 질문하고 따지고 검증해야 하는 주장이 된다. 이것이 바로 고등학교와 대학의 핵심적 차이다. 남들의 까다로운 질문공세에 답하고 방어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스스로 질문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무엇을 전공하든 대학교육이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덕목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증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시민적 의심과 합리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민정신의 토대 위에서 학문공동체가 작동하고, 졸업 후 경험할 기업이나 사회조직들이 작동하고, 건강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과연 보람있는 일일까?
다음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체크해보자.
- 어떤 사실에 관한 질문에는 한 가지 정답만 존재한다.
- 가장 이상적인 과학은, 어떤 문제에 대해 한 가지 정답만 갖는 것이다.
- 깔끔하게 정답이 떨어지지 않는 문제에 골몰하는 것은 시간낭비다.
- 강의든 토론이든, 교수가 알아서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을 선택해 가르쳐야 한다.
- 좋은 선생은 학생들이 정해진 트랙에서 벗어나 헤매지 않도록 인도해야 한다.
- 교수들이 허황된 이론에 대해 덜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춰 가르치면 대학 에서 훨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까지는 선생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배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말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는다. 다시 말해 정답을 말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교수들은 대부분 그런 정답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이 더 많은 질문을 하기를 원한다. 자신이 읽고 들은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주장에 어긋나는 이유나 근거를 찾아내 반론을 제기하는 학생을 좋아한다.
위의 질문 중에 동의하는 진술이 많을수록, 당신의 대학생활은 그다지 즐겁지 않았을 것이다. 대학교수들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와 계속 충돌할 것이고, 질문만 퍼붓고 정답은 별로 제시하지 않는 수업이 불만스럽기만 했을 것이다. 교수들이 질문을 쏟아내는 것은 학생들에게 확정된 사실이 아닌 열린 진실, 기계적으로 외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닌 회의적인 탐구를 향한 열정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다. 대학은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건강한 시민과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M. P. Ryan.“Monitoring Text Comprehens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Epistemological Standard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1984): 250.
이 글은 논증의 탄생과 스타일레슨에서 발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