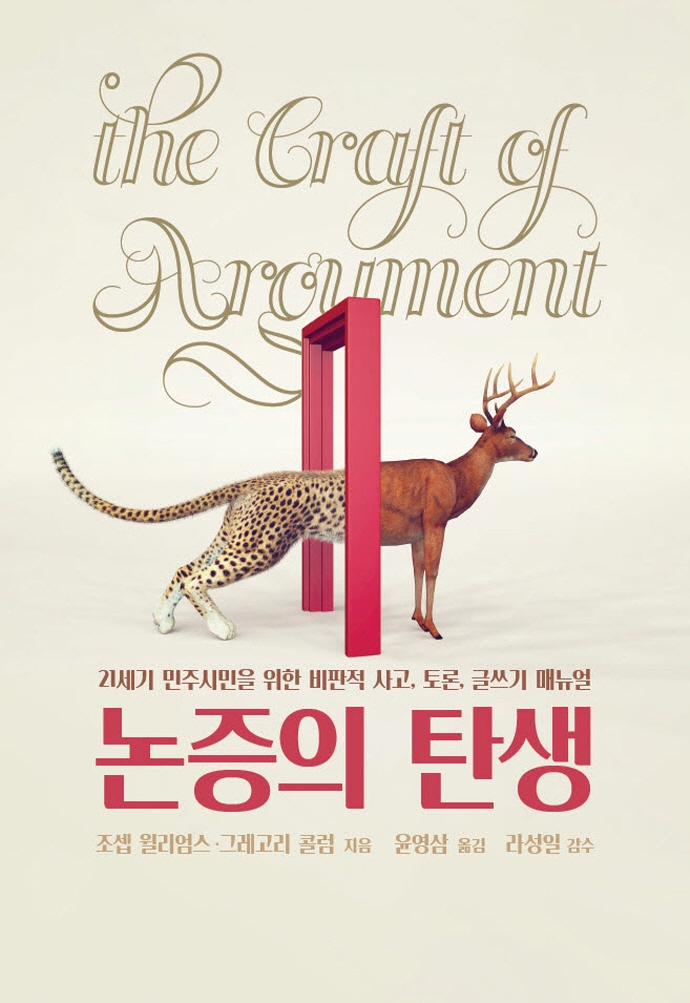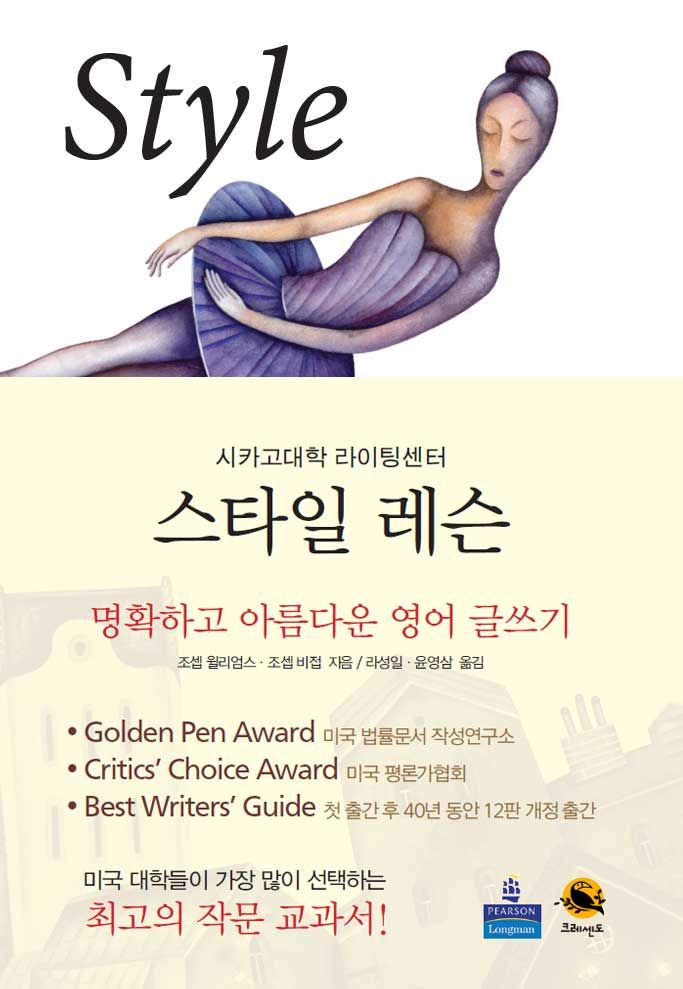Series Reading 논증의 탄생 5
사실 우리는 논증 전성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논증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일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나운 목소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증이든(정치토론), 알랑거리며 상대방을 유혹하는 논증이든(광고), 결국 똑같은 결과를 야기한다. 사려 깊은 사람들이 논증에 뛰어드는 것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정치집단은 막말을 하고 추태를 정치판을 어지럽게 만들어 사려 깊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킨다.
건강한 시민의식과 성숙한 토론문화가 작동하지 않는 순간, 진실은 사라지고 비합리적인 여론이 세상을 휩쓸고 만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논증의 본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논증이 최악의 형태로 타락한 모습에 불과하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갈수록 진실의 힘은 더욱 커지듯, 나쁜 논증이 판치는 세상일수록 좋은 논증은 더욱 빛나는 법이다.
물론 아무리 완벽한 논증이라고 해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강력한 권력을 지닌 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라면, 더더욱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정치의 세계에서 결국 힘을 발휘하는 것은 논리나 근거가 아닌 권력과 세력이며, 따라서 합리적인 논증이나 토론은 모두 부질없는 짓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러한 비관적 생각은 논증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널리 퍼졌을 때 세상이 훨씬 합리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엄연한 진실에 눈을 감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빌붙어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하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데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허약한 논증은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대중에 의해 결국 실패를 맞이하고 말 것이며, 역사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진짜 논증은 문제해결의 열쇠를 제공한다
논증이 최선의 형태로 발현될 때, 논증은 시민들이 힘을 모아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하는 수단이 된다. 물론 논증을 하다 보면 치열하게 달아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논증이라면 그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다른 형태의 설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상대방을 강압하거나 회유해서 마음에도 없는 결론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논증에 참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협력한다는 뜻이고,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찾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논증은 상대방을 공격하지도 않고 유혹하지도 않는다. 다만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서로 주고받으며 검증해나갈 뿐이다.
진짜논증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둥이다
논증은 물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논증의 효용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합리적 개인’은 곧 ‘합리적인 시민’이 되고 이들이 모여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낸다.
비합리적인 사고와 억지주장과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이 판치는 세상일수록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주장을 내세울 줄 아는 사람은 빛나는 법이다. 오늘날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키는 최고의 덕목은 바로 ‘비판적 판단능력’이다.

비판적 사고와 좋은 논증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우리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혼란스러운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핵심기술이다. 독재자는 논증할 필요가 없다. 아무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토를 달지 않을 것이며 억지를 부려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치자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대표자를 뽑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 문제를 제기하고, 논쟁하고 해법을 찾아줄 사람을 뽑는 것이다. 언론이나 정치평론가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 또 권력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논증이 타당한지, 또 그들이 그러한 논증에서 도출한 해법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대신 관찰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 언론은 존립할 가치가 없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에 대해 그들이 대답할 때 제대로 작동한다. 하지만 논증은커녕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 더 나아가 문제를 찾기 위해 뭘 질문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을 대표자로 뽑았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순간, 민주주의사회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
온갖 토론과 논쟁으로 소란스러운 시민사회국가에 비해…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과학적’ 전체주의는 언뜻 훨씬 합리적인 사회처럼 보인다… 하지만 20세기를 거쳐 간 전체주의적인 세 지배체제—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비합리적 요소를 품고 있다. 진정한 토론이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버트 콩퀘스트 Robert Conquest, Reflections on a Ravaged Century. New York: Norton, 2001: 83–84.
진짜논증은 AI시대의 생존경쟁력이다
민주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단순히 어떤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넘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의 정당성과 정합성까지 평가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인재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그러한 인재들이 공공영역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노동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측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탁월한 사고력을 갖춘 사람, 무엇보다도 그렇게 얻은 결론을 명확하고 설득력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은 대학들에게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는 것을 핵심적인 교육목표로 삼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른 이들의 논증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 합리적인 논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AI가 지배하는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귀한 경쟁력이다.
이 글은 논증의 탄생과 스타일레슨에서 발췌한 것입니다.